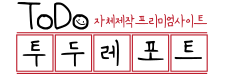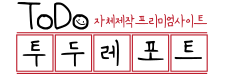[헤럴드경제=채상우·김빛나·박혜원 기자]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있었던 직장인 김모(35) 씨. 도로 위에 놓인 수십 구의 시신을 본 그는 그 이후로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회사에 병가를 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태원에 놀다와서 병가를 내느냐”는 비아냥 뿐이었다. 김씨는 “사고를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주변을 지나다가 충격을 받은 것인데 아직은 한국 사회에서 이런 부분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태원 참사로 인한 트라우마로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트라우마를 ‘꾀병’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는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0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는 이태원 참사 심리지원단이 지난달 30일~이달 8일까지 10일간 진행한 상담 건수는 2527건에 달한다. 하루 250건이 넘는 수치다.
트라우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가벼운 두통과 악몽을 꾸는 것부터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식이장애, 환청, 환시까지도 나타난다. 당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던 김모(29·여) 씨는 “악몽을 계속 꾸고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환청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로 인해 PTSD 진단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트라우마를 가볍게 보는 이들이 많다.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들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을 했던 김진욱(18) 군은 “지금도 과호흡과 환청 등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그런데도 주변인들은 ‘놀다가 죽어도 싸다’ 등 트라우마를 자극할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다”고 털어놨다.
현장을 수습했던 소방관의 경우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받지 못하고 있다. 소방노조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재난 상황과 참혹한 현장 곳곳마다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왔지만 이러한 임무 수행은 소방관들의 기억 공간을 참혹하게 바꾼다”며 “PTSD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은 “트라우마는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을 때 생기는 것”이라며 “이는 생존적인 반응으로 너무 강력할 수밖에 없다. 트라우마는 자율신경계와 호르몬이 다 흔들리는 것으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상우 123@heraldcorp.com김빛나 binna@heraldcorp.com박혜원 klee@heraldcorp.com
"“놀러갔다 온 게 자랑이냐”…트라우마 외면하는 사회[이태원 참사]"- 헤럴드경제 (heraldcorp.com)